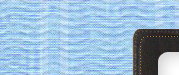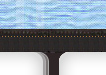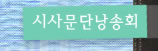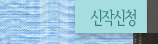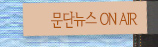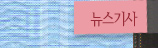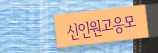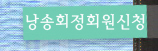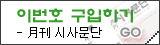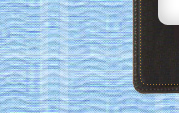우리 사랑했는가, 열심으로 사랑했는가.(2)
페이지 정보
작성자 : ) 댓글 1건
조회 1,654회
작성일 2007-08-03 19:11
) 댓글 1건
조회 1,654회
작성일 2007-08-03 19:11
본문
우리 사랑했는가, 열심으로 사랑했는가.(2) 한관식
여명의 기운으로 새벽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가로등이 진저릴 치는 깊은 시간, 포유동물에게 할당된 시간으로는 적합하지 못한, 삶이 고갈된 도로를 휘적휘적 걸었다. 불빛이 닿지 못한 곳에 이슬이 맺혀 있었다.
-남기자. 그렇지? 아직 집에 들어가긴 억울하지? 연중무휴, 스물 네시간 영업하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 올 거지?
박부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앞서 걸었다. 세상의 반을 살은 그의 걸음은, 그만큼 비틀 거렸다. 지하도를 타고 내려오자, 신문지로 얼굴을 덮은 노숙자가 후미진 곳에 어둠처럼 엉켜 있었다. 지하도의 깊숙한 곳에 불빛이 카랑카랑 새여 나오고 있는 곳을 향한, 박부장이 휠끗 나를 쳐다보았다. 내 눈과 마주치자, 멋쩍게 씨익 웃었다. 나는 괜히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음에 답해 주었다.
-난 늘 이집에 올 때 마다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지. 연중무휴, 스물 네시간 영업이면서 왜?...왜?
때마침 주문을 받기 위해 온 아저씨가 물을 앞에 놓았다. 아저씨의 조끼엔 부대찌게 전문이라고 큼직막하게 쓰여 있었다.
-부대찌게 작은 것, 소주 주세요.
가슴까지 바지를 치켜 올려 허리끈을 졸라 맨 아저씨가 뒤뚱뒤뚱 광대처럼, 주방을 향하는 모습에서 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박부장은 엄청난 비밀이라도 누설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런 이집이 왜?....셔터가 있느냐 말이야. 적어도 문 정도는 이해되지만 셔터는, 필요 할까. 그렇지?
-하하, 한번 아저씨에게 물어 보시죠.
-쿠, 무서워...주방 쪽으로 데리고 가서 쓱싹 요리해 버릴 것 같아. 쿠쿠.
취하고 싶어, 그리고는 내내 술잔을 비웠다. 네병째 술이 날라져 왔을 때, 박부장의 혀가 조금 감겨들고 있었다.
-오늘, 아니 정확히 어제이구먼. 사장실에 불려갔지. 그렇지. 취임식 하기 전에...전무도 와 있더구먼. 말을 빙 돌리며 얘기하지 못한다나, 어쩐다나. 편집된 기사를 사장이 검열한 뒤 인쇄소로 넘길 꺼라는. 흐흐흐. 난 아까 열 일곱명 앞에서는 차마 얘기 할 수 없었어. 호랑말코 같은 이 현실 앞에서 한마디, 그래, 그 자리에 전무가 한몫, 단단히 하더구먼. 인정해 버리면 서로 피곤하지 않을 꺼라고, 눈을 껌뻑거리잖아.
나는 갑자기 취기가 확 달아올랐다. 이런 개새끼!
마음속으로 내뱉은 말이 밖으로 새여 나올 정도로, 내게 까지 ,크게 울렸다. 박부장이 눈을 치켜뜨며 나를 쳐다 보았다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싸지.
박부장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겨냥한 개새끼의 표적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청과물 이사장 경력을 떼어내고 언론매체의 사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권위의식의 사장, 자리에 연연하여 옳고 그름조차 모호해진 전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던 울타리 안에서 꼿꼿했던 부장의 우유부단함, 어느 쪽을 향해 힘껏 개새끼라는 돌팔매를 던졌을까. 나는 한 숨을 표창처럼 던졌다. 날캄한 한 숨이 날아가서 멈춘, 땟국 절은 환풍기 날개에 꽂히고, 사력을 다하는 가로등 불빛에 꽂히고 , 박부장의 자글자글한 눈가의 주름살에 꽂혔다. 주방의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아저씨의 헤 벌어진 입속에도 꽂혀 있었다.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것일까. 새벽의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 사람들이 폴폴 모습을 드러 내었다. 박부장은 자신의 어깨에 파묻혀 있었다.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는 세상의 무게에 압사 할 것 처럼 힘겨워 보였다. 부장님, 저는 다만...
-알고 있어. 남기자. 말하지 않아도..설사 내게 개새끼라고 해도...나,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장기판에 졸이 아니었는데,
그는 내게 악악 소리치고 있었다.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진 그의 음절은 이미 악악으로 조합되고 있었다.
-변명 할 기회를 주겠나. 수십년간 누구에게도 얘기 할 수 없었던, 그러면서 나를 길들게 했던, 내 안에 잠재 되어 끊임없이 주눅 들게 했던... 얘길, 들을수 있는 자네가 되어 주겠나?
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졸다가, 중심을 잃고 태엽 풀린 장난감 병정처럼 픽 쓰러지던 아저씨가 가까스로 안정 된 자세를 잡았으나, 이내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혹 그 모습을 들키지 않았을까 하는 눈으로 우리를 쳐다 보았다. 나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저, 못보았어요. 비로서 안심이 된 아저씨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졸았다.
-팔십년 광주, 나는 그 곳에 있었지.
그곳에 있었다.
고등학교 이학년이었고 광주 어느 곳에 사는 삼학년과 펜팔을 하고 있었다. 편지를 주고 받다보면 수려한 미사여구에 스스로 길 들여지게 되고, 탐닉하다 보면 편지를 쓰는 자신조차도 내용이 모호해 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그 나이에 맞는 호기심으로 만나기를 결심하였다. 광주는 태풍의 눈처럼 적막하고 고요하였다. 무언가 수상한 낌새는 어느 곳에서든지 무성하게 소문은 나돌았지만, 신문에도 텔레비전에도 라디오에도 단 한 줄의 기사, 단 한마디의 논평도 없었다. 우후죽순처럼 나도는 소문만으로 만나는 것을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였다. 금남로 시계탑에서 빨간 표지의 책을 들고 있으면 찾아간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부터 부산하게 서둘러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양복을 훔쳐 입고. 광주로 가는 기차는 하루에 한대 밖에 없었다. 그것도 검문에 통과 된 사람들만 광주에 입성할 수 있었다. 나는 앞뒤 잴 것도 없이 기차에 올라탔다. 그곳에 그녀가 있다는 절박함으로.
화장실에서, 기차의 덜컹거리는 이음새에서, 교묘하게 이 칸 저 칸을 숨박꼭질 하여 가까스로 광주에 도착하였다.
광주는 연기로 자우룩했다. 쉴 새 없는 총성, 아우성, 산발적인 포성. 비명, 울음,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소름이 돋도록 두려웠지만 돌아 갈수 도 없었다. 이제 금남로의 시계탑만이 광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목표였다. 그녀를 만나면 뭔가 해답을 얻으리라.
시민군속에서 기웃거리며 물어물어 시계탑까지 왔다. 금남로의 시계는 멈춰 있었다. 비둘기 몇 마리 하늘을 날고, 몇 마리 시계탑 주위를 할 일 없이 배회하고 있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무너진 질서, 널브러진 상처, 곳곳에 상처로 덧나고 있는 흔적들이, 찢어지고 흩어지고 펄럭이고 있었다.
계속
추천1
댓글목록
윤주희님의 댓글
더위에 무탈하시며 늘 좋은 글 건필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