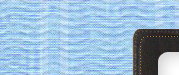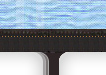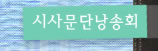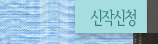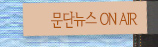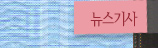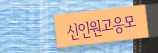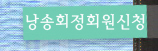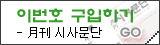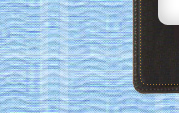떡갈나무 가지마다 붙여놓은 사랑의 단풍잎 연가-안재동의 詩, <이 가을에 너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박인과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 ) 댓글 5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005-10-26 09:44
) 댓글 5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005-10-26 09:44
본문
가을의 정취에 물들어 보기 전에 사고의 후유증으로 잠시 입원해 있는 저로서는
이 한 편의 가을의 시가 주는 정서의 꽃바구니가 한 껏 그립게 되었었습니다.
<~ 아침이면 / 심장을 갓 박차고 나간 선혈처럼 / 솟구치는 그리움이
저녁이면 / 소금에 저려진 고등어처럼 / 정맥을 타고 되돌아온다. ~>-안재동의 '이 가을에 너는' 中에서.
어쩌면 봄이 모든 상념의 날개를 달고 항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면
역시 가을은 온갖 잡념들을 잠재우고 가라앉아야 할 숙명의 나뭇잎처럼 다가오는,
時間의 영속성 속에서 쪽마늘처럼 다져지는 無時間性의 본질로의 귀향이 진하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떤 간이역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다.
가야할 우리의 존재의 참다운 비존재성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 몸부림은
필히 언젠가는 돌아가야할 고향의 향수를 그리며 우리의 마음은 여물어 가고 또한 방황하며
서러움의 조약돌들처럼 다져지며 흘러 흘러 떠 가야만 할 시간의 비연속성의
불협화음의 마디마다 恨의 모퉁이로 쓰러진 담장 곁으로 삐져나와 꽃향을 뿌리는
코스모스의 눈빛 찬란한 하늘빛 그리움처럼 도사리고 앉아 꿈처럼,
정말 꿈길의 싸늘한 몽정처럼 詩의 마디마디에, 고춧가루 매운 어느 아낙네의
장독대 어디 쯤에서 아니면 뒤꼍 쑥부쟁이 뿌리 내리는 無心의 햇빛 알갱이들
몇 몇이, 가출한 싸리나무 울타리 흔들리는 가시나무 솟은 쨍쨍한 가시들의 끝 어딘가에서 태양의 종기가 찔려 흐느끼듯
시간이 한의 물빛으로 풀빛으로 바래고 바랜 청바지의 헤진 구멍처럼 날리는 낙엽들이,
낙하하는 바위산 억새풀밭 자갈밭 쯤에 산새알 물새알처럼 비릿한 시의 알 두어 개씩
흘리기 위한 창조의 울음으로 일어선다고 본다.
파랗게 질린 한 편의 詩가 알 낳는 빈 존재의 알찬 느낌과 충만의 계절을 위하여 "아침이면 / 심장을 갓 박차고 나간 선혈처럼 " 솟구치는 그리움 하나 캐며 길을 가지만 이내 "소금에 저려진 고등어처럼 / 정맥을 타고 되돌아" 오는 너를 향하여 독백처럼 뱉고 있는 안재동의 시는 가을이어서 더욱 절절하다. 흘러가버린 시간의 소금으로 절여진 삶의 생선이 맛나는 감칠맛을 띄우기엔 역시 가을이라는 영구불변의 양념이 단풍처럼 벌겋게 싸늘하게 식어진 정맥처럼 향수를 불러일으켜야만 하는 계절의 속성이 죽음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가을 아침으로 온다.
싱싱한 하늘 밑에서 숨 죽인 애인의 눈망울 닮은 이슬방울들처럼
가지런히 정돈된 맑은 한의 향연이 "나는 너에게 / 아무 것도 아니지만 / 너는 나에게 /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라는 단정적인 표현의 압축미 속에서 이루어진다.
안재동의 詩世界는 삶의 마디다디를 물들인
푸른 恨의 갈피 갈피에 서려있는 정념보다도 그리운 이야기를 어느 바람에게
"새하얀 종이에 / 너에게 부치지도 못할 / 편지를" 쓰는 작업의 냉냉한 가슴의 뜨거운
사랑의 단풍잎 연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릴케의 / 연시 한 수를 우표삼아 붙여 / 갈바람에 띄워 전하 "는
가을의 시인이기에 설레임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노을로 서있는 치자나무 흔들리는
여인의 창문 곁으로 가 목청 높이어 연가를 불러야만 될 시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을이면 누구나 센티멘탈 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비좁은 언어의 틈바구니 속에서라도 읊어야만 할 때가 있고
마음껏 내 자신의 존재를 향하여 소리의 심장들을 내뱉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있음으로 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간이역 쯤 되는 가을이라는 서정의 툇마루 부근 풀벌레 울음소리 미끌어지는 문턱으로 서성거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을에 깊음과 높이에 넓게 넓게 빠져버린 안재동의 시편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인 것이다.
이 가을에 서성이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리움으로
소비되는 여백으로써 남아 허전한 옆구리를 더욱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보다 차원 높은 삶의 깊이를 온 몸으로 마시며 시를 마시며
아주 작은 여유 하나 쯤을 부려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부정적 자연의 성격을 긍정적인 자신만의 감성의 압축기를 통해 농도 짙은 시의 언어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고 또한 불안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깊은 절망의 우물에 빠져버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튼실한
우울의 늪을 헤어나올려면 그 우울의 심장 깊이 헤엄쳐 가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이 가을의 정취가 우리의 심장과 맞닿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안재동의 시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으로 고동쳐 오는 것이고 우리의 절망이
저녁에 "소금에 저려진 고등어처럼 / 정맥을 타고 되돌아" 올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안재동 시인님 저는 작품이 좋으면 좀 거기에 잠시 빠져들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작품이 좋아서 넋두리를 푸념처럼 흘리고 간 낙엽의 소리라고 여겨주십시요.
..................................................................
* 이 가을에 너는 * / 안재동
나는 너에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너는 나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가을이 짙어갈 때면 늘
불그스레한 단풍잎에
살로메에게 보낸 릴케의
연시 한 수를 우표삼아 붙여
갈바람에 띄워 전하고 싶다.
황금빛 들녘이
노을로 붉게 타오르면
단걸음에
치자나무 서 있는 쪽으로 난
네 방 창문 앞으로 달려가
목청 높은 풀벌레가 되거나
청아한 가을 하늘의
쪽빛 구름으로 떠돌다
스잔한 바람에 밀려
들길을 지나가는 너의 옷깃이나
스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을새 날개짓에 놀라 떨어지는
떡갈나무 갈색 잎새들은
오래도록 너에게 전하지 못한
내 시린 마음의 부스러기.
햇살 부신 아침이면
심장을 갓 박차고 나간 선혈처럼
솟구치는 그리움이
저녁이면
소금에 저려진 고등어처럼
정맥을 타고 되돌아온다.
나는 너에게
아무 것도 아니기에
내가 너에게서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기에
내가 너에게
마음을 보내고 싶은
그런 가을이다.
여느 때처럼
나는 오늘밤도 창문 활짝 열고
농익은 단풍잎을 스친
빛깔 고운 바람에 가슴 설레며
새하얀 종이에
너에게 부치지도 못할
편지를 쓴다.
................................................................
이 한 편의 가을의 시가 주는 정서의 꽃바구니가 한 껏 그립게 되었었습니다.
<~ 아침이면 / 심장을 갓 박차고 나간 선혈처럼 / 솟구치는 그리움이
저녁이면 / 소금에 저려진 고등어처럼 / 정맥을 타고 되돌아온다. ~>-안재동의 '이 가을에 너는' 中에서.
어쩌면 봄이 모든 상념의 날개를 달고 항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면
역시 가을은 온갖 잡념들을 잠재우고 가라앉아야 할 숙명의 나뭇잎처럼 다가오는,
時間의 영속성 속에서 쪽마늘처럼 다져지는 無時間性의 본질로의 귀향이 진하게
다가오는 인생의 어떤 간이역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다.
가야할 우리의 존재의 참다운 비존재성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 몸부림은
필히 언젠가는 돌아가야할 고향의 향수를 그리며 우리의 마음은 여물어 가고 또한 방황하며
서러움의 조약돌들처럼 다져지며 흘러 흘러 떠 가야만 할 시간의 비연속성의
불협화음의 마디마다 恨의 모퉁이로 쓰러진 담장 곁으로 삐져나와 꽃향을 뿌리는
코스모스의 눈빛 찬란한 하늘빛 그리움처럼 도사리고 앉아 꿈처럼,
정말 꿈길의 싸늘한 몽정처럼 詩의 마디마디에, 고춧가루 매운 어느 아낙네의
장독대 어디 쯤에서 아니면 뒤꼍 쑥부쟁이 뿌리 내리는 無心의 햇빛 알갱이들
몇 몇이, 가출한 싸리나무 울타리 흔들리는 가시나무 솟은 쨍쨍한 가시들의 끝 어딘가에서 태양의 종기가 찔려 흐느끼듯
시간이 한의 물빛으로 풀빛으로 바래고 바랜 청바지의 헤진 구멍처럼 날리는 낙엽들이,
낙하하는 바위산 억새풀밭 자갈밭 쯤에 산새알 물새알처럼 비릿한 시의 알 두어 개씩
흘리기 위한 창조의 울음으로 일어선다고 본다.
파랗게 질린 한 편의 詩가 알 낳는 빈 존재의 알찬 느낌과 충만의 계절을 위하여 "아침이면 / 심장을 갓 박차고 나간 선혈처럼 " 솟구치는 그리움 하나 캐며 길을 가지만 이내 "소금에 저려진 고등어처럼 / 정맥을 타고 되돌아" 오는 너를 향하여 독백처럼 뱉고 있는 안재동의 시는 가을이어서 더욱 절절하다. 흘러가버린 시간의 소금으로 절여진 삶의 생선이 맛나는 감칠맛을 띄우기엔 역시 가을이라는 영구불변의 양념이 단풍처럼 벌겋게 싸늘하게 식어진 정맥처럼 향수를 불러일으켜야만 하는 계절의 속성이 죽음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가을 아침으로 온다.
싱싱한 하늘 밑에서 숨 죽인 애인의 눈망울 닮은 이슬방울들처럼
가지런히 정돈된 맑은 한의 향연이 "나는 너에게 / 아무 것도 아니지만 / 너는 나에게 /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라는 단정적인 표현의 압축미 속에서 이루어진다.
안재동의 詩世界는 삶의 마디다디를 물들인
푸른 恨의 갈피 갈피에 서려있는 정념보다도 그리운 이야기를 어느 바람에게
"새하얀 종이에 / 너에게 부치지도 못할 / 편지를" 쓰는 작업의 냉냉한 가슴의 뜨거운
사랑의 단풍잎 연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릴케의 / 연시 한 수를 우표삼아 붙여 / 갈바람에 띄워 전하 "는
가을의 시인이기에 설레임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노을로 서있는 치자나무 흔들리는
여인의 창문 곁으로 가 목청 높이어 연가를 불러야만 될 시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가을이면 누구나 센티멘탈 해 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비좁은 언어의 틈바구니 속에서라도 읊어야만 할 때가 있고
마음껏 내 자신의 존재를 향하여 소리의 심장들을 내뱉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때가 있음으로 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간이역 쯤 되는 가을이라는 서정의 툇마루 부근 풀벌레 울음소리 미끌어지는 문턱으로 서성거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가을에 깊음과 높이에 넓게 넓게 빠져버린 안재동의 시편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인 것이다.
이 가을에 서성이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리움으로
소비되는 여백으로써 남아 허전한 옆구리를 더욱 서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보다 차원 높은 삶의 깊이를 온 몸으로 마시며 시를 마시며
아주 작은 여유 하나 쯤을 부려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부정적 자연의 성격을 긍정적인 자신만의 감성의 압축기를 통해 농도 짙은 시의 언어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고 또한 불안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깊은 절망의 우물에 빠져버려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튼실한
우울의 늪을 헤어나올려면 그 우울의 심장 깊이 헤엄쳐 가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역시 이 가을의 정취가 우리의 심장과 맞닿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안재동의 시는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으로 고동쳐 오는 것이고 우리의 절망이
저녁에 "소금에 저려진 고등어처럼 / 정맥을 타고 되돌아" 올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안재동 시인님 저는 작품이 좋으면 좀 거기에 잠시 빠져들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작품이 좋아서 넋두리를 푸념처럼 흘리고 간 낙엽의 소리라고 여겨주십시요.
..................................................................
* 이 가을에 너는 * / 안재동
나는 너에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너는 나에게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가을이 짙어갈 때면 늘
불그스레한 단풍잎에
살로메에게 보낸 릴케의
연시 한 수를 우표삼아 붙여
갈바람에 띄워 전하고 싶다.
황금빛 들녘이
노을로 붉게 타오르면
단걸음에
치자나무 서 있는 쪽으로 난
네 방 창문 앞으로 달려가
목청 높은 풀벌레가 되거나
청아한 가을 하늘의
쪽빛 구름으로 떠돌다
스잔한 바람에 밀려
들길을 지나가는 너의 옷깃이나
스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을새 날개짓에 놀라 떨어지는
떡갈나무 갈색 잎새들은
오래도록 너에게 전하지 못한
내 시린 마음의 부스러기.
햇살 부신 아침이면
심장을 갓 박차고 나간 선혈처럼
솟구치는 그리움이
저녁이면
소금에 저려진 고등어처럼
정맥을 타고 되돌아온다.
나는 너에게
아무 것도 아니기에
내가 너에게서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기에
내가 너에게
마음을 보내고 싶은
그런 가을이다.
여느 때처럼
나는 오늘밤도 창문 활짝 열고
농익은 단풍잎을 스친
빛깔 고운 바람에 가슴 설레며
새하얀 종이에
너에게 부치지도 못할
편지를 쓴다.
................................................................
추천4
댓글목록
안재동님의 댓글
안재동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박인과 시인님, 평론에 감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빈 여백에 소개되는 박 시인님의 시평
한 편 한편이 모두 빛나며, 빈여백을 꽉 채워버리는 듯한 느낌을 언제나 받습니다.
입원해 계신다니, 모쪼록 몸조리 잘 하시고 가을의 정취를 허허롭게 보내지 않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인과님의 댓글
박인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감사합니다. 항상 안재동 시인님의 격려가 제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김태일님의 댓글
두 분 선배 시인님들이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창 밖에서 듣다 보니
옛날 어느 샘물가에서 하얀 허벅지 살짝 드러내어 도란도란 정답게 이야기 하며
열심히 빨래를 하던 동네 처녀들 생각이 언듯언듯 머리를 스치는군요.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하얗게... ^^
고은영님의 댓글
가을의 그리움이 가득 밴
좋은 글앞에 한참을 서성댑니다.
박인과님의 댓글
박인과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김태일 시인님, 신문에서 뵈었습니다. 스크랩 해두었습니다.
고은영 시인님, 날마다 용기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