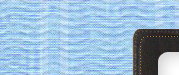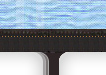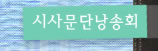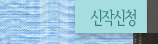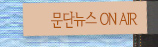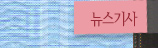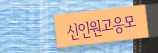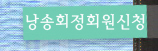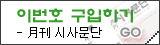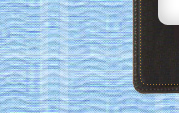“백년 원수 천년 원수 아이고 내 팔짜야. 술 처묵고 쩌그 어디 뻐드러져 잇는 갑다. 언능 동생 덱고 가서 느그 아부지 찾아오그라.”
방과 후에 담임선생님 일손을 도와드리다가 땅거미가 늬엿늬엿 넘어갈 때쯤 집에 돌아왔더니 여느 때처럼 행상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가 넋두리를 섞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유년 시절의 방과 후 시간은 아버지를 찾아 헤맨 기억 밖에 없다고 생각될 만큼 아버지를 찾으러 다닌 적이 많았다.
유년 시절 내 눈에 비친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다. 할머니는 오죽했으면 결혼까지 한 종갓집 장남인 아버지를 매몰차게 쫓아 내버렸을까? 아버지는 오두막집 작은 방 한 칸을 빌려 아직 코흘리개인 남동생 둘을 데리고 쫓겨났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쫓겨났고 나 혼자 할머니 슬하에 남겨져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모와 떨어진 채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 슬프게도 내가 할머니 슬하에 남게 된 것은 나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가 쫓겨나가는 그 오두막의 작은 방 한 칸에 어린 내 몸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좁았기 때문이다.
무능력한 아버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활력이 강해진 어머니는 옥수수, 배, 김, 다시마, 멸치, 마늘 등 그 계절에 맞는 품목을 산지에 가서 도매로 떼 와서 시골의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팔았다. 그 덕분에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낡고 허름한 집이나마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한 어머니는 제일 먼저 할머니 슬하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잔뜩 주눅 든 채로 사는 나를 데려갔다.
아아, 그 때의 그 감격 초등학교 1학년인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전율과도 같은 것이었다. 비록 두 남동생과 한 방을 써야 했지만 내 부모 밑에서 보리밥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눈물겨운 감격이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나는 할머니 슬하에서 눈칫밥 먹던 그 옛날이 더 좋았다는 생각에 그 시절이 그립기까지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행상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엄마를 대신하여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보리쌀을 끓여서 밥을 지어야 했고, 집안 청소, 빨래 등을 해야 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보다 나를 더 못 견디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찾으러 다니는 일이었다. 죽기보다 싫은 그 일. 차라리 죽고 싶었다. 아버지는 배추가 소금에 절여 있듯 술에 절여 살았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은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술만 마시면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싸우거나 얻어맞고, 그도 아니라면 길바닥이고 도로변이고 구분하지 않고 잠들기 일쑤였다.
그 날도 그랬다. 아직 첫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하얀 서리가 융단처럼 깔리는 초겨울이니 술 먹고 길바닥에서 잠든 아버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체온 저하 내지 얼어서 죽을 것이다. 리어카를 끌고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남동생을 재촉하여 시장통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어김없이 시장통 쓰레기더미 옆에 잠들어 있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시장통에서만 잠드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오일장인 날은 십중팔구 시장통에 잠들어 있었다. 나의 학교 가는 길목에 쓰러져 잠들 때도 있고, 읍사무소 근방이나 마을회관 근처, 심지어 하수구가 흐르는 도랑가에서 발견할 때도 있다. 여러 곳 중에서 나를 가장 참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나의 학교 가는 길목 아니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누워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발견할 때이다. 친구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하교하는 그 길에서 친구들의 웅성거림을 들으며 아버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벼랑 끝에 선 절망감보다 더 강렬한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는 말을 떠올리며 부끄러움과 절망감으로 치를 떨어야 했다.
“이 징글징글헌 웬수야, 요러케 살라먼 차라리 데져뿌러라. 에편네는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점심도 쫄쫄 굶음스롱 모가지 빠지게 물건 이고 다니먼서 포니라고 성한 곳이 읍는디 서방이라고 하나 있는 거슨 허구헌날 술만 퍼마시고 있으니 뭔 재미로 산다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먼 진작에 쏴부럿을 꺼여.”
이런 식의 어머니의 신세 한탄은 우리 남매의 귀에 딱지가 앉아 단단한 각질 속 티눈이 될 만큼 아프고 아픈 슬픈 주문이었다.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쏘아 버리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이 그 순간 어린 내 몸을 휩싸고 돌았다면 사람들은 과연 이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하교하는 친구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한쪽 귀퉁이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사라지면 잔뜩 겁먹은 모습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버지 앞에 나타나 아버지를 깨워서 부축하고 걷는 그 길은 아마도 지옥으로 가는 길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는 청소부인 아버지는 아버지가 누워 있는 곳의 배추 쓰레기, 생선 쓰레기와 닮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몹시 미워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다면 짝꿍 정태처럼 커다란 급식빵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할머니를 모시면서부터 아버지는 그 좋아하던 술도 끊고 새사람이 되어 가정에 충실했다. 온순하고 자상한 아버지로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었지만 아버지로 인해 어린 날에 입은 마음의 상처는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도망치듯 결혼한 나는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안 봐도 되어 살 것 같았다.
2009년 폭염의 정수리 지점인 8월 23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여섯 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은 나를 두 달 동안 곁에서 나의 팔다리가 되어 병간호를 극진히 해주었다. 아아, 아버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하룻밤에도 몇 번씩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 6인 병실의 그 불편한 잠자리를 마다하지 않으며 대소변 다 받아내며 눈물겹게 병간호하던 72세의 늙은 아버지. 아버지의 극진한 병간호 덕분인지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듬해 3월에 그만 다시는 못 올 먼 곳으로 가고 말았다.
아버지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꾼 것인지 모른다. 태어나서 처음 맛보았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순간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나를 사랑했던 것이다. 힘겹게 잠든 아버지가 깰까 싶어 병석에 누워 신음 소리를 참다가 어쩌다 나도 모르게 신음 소리를 내면 아버지는 귀신처럼 일어나 내 손을 잡고 간호사를 불러오고 내가 잠들 때까지 뜬눈으로 머리맡을 지켰다. 굵은 주름살, 구부정한 어깨, 윤기 잃은 흰머리카락의 그런 아버지를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애써 외면하며 나는 내가 왜 이런 사람을 그토록 미워했을까를 되뇌이며 마음 속으로 울었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내 몸을 휩쓰는 극도의 통증을 달래곤 했다.
얼마 전 어머니 혼자 계시는 친정집에 다녀왔다.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회한이 지금껏 나를 울리고 있다.
“니 수술해야 산다는 이야기 듣고 느그 아부지가 화장실에서 혼자 을매나 울었는지 니는 모를꺼다.”
“…….”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내미 살리야 쓴다고 저녁내 잠 한심 못 자던 느그 아부지 잊어뿔먼 못 쓴다.”
어린 시절 술 마시고 아무 데서나 잠든 아버지를 찾기 위해 걷던 그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참혹하던 기억을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지우려고 한다. 병든 딸의 머리를 감기고 수술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온 신경을 쓰며 목욕을 시켜주던 아버지 그런 따스하던 아버지만을 기억하며 오늘 밤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조기 매운탕과 싱싱한 산낙지 탕탕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꿈 속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겠다.
‘아버지, 오늘 밤 꿈 속에 꼭 와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 댓글 4건
조회 2,392회
작성일 2013-11-24 21:38
) 댓글 4건
조회 2,392회
작성일 2013-11-24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