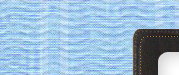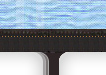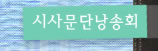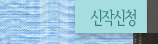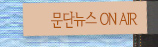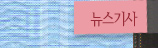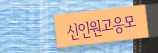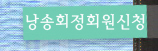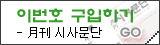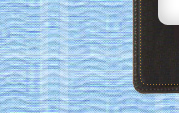단편/ 택근아 소주 사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 댓글 1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005-11-14 12:07
) 댓글 1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005-11-14 12:07
본문
지금은 엽서한장 보낼수 없는 먼 곳에 계신 할머니...
천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되어있겠지요
할머니가 계신 나라에 이 글을 띄울수만 있다면...
** 김석주 短篇小說 ***
- 택근아 소주 사왔다... -
할머니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후욱허- 후욱허- 힘들이 내 쉬시며
택..근..아.. 택..근..아 만을 연신 되뇌이고 계셨다.
평생(生)을 사시면서 마치 그 이름 하나 밖에는 모르셨다는 듯 할머니가
부르시는 그 힘든 생언(生言)은 한숨으로 도배된 회색빛 중환자실 사이를
시계추마냥 일정하게 퍼져가고 있었다. 택근은 할머니의 손을 살포시 쥐었다.
"할머니 나야 택근이, 말 많이 하지마 힘들어.."
"태..그나.. 태끈아.. ... 태..끄나.. 택끄나.."
시계바늘이 여섯시에 다다르자 약속이나 한 듯 간호사들은 곳곳으로 흩어져
면회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면회시간 끝났습니다 ... 보호자분들은 나가주세요.."
하지만 택근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만을 부르고 계신
할머니를 두고 무참하게 나올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저기요 면회시간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께요.. 조금만 더 ... "
간호사는 움찔 물러서게 되었다. 주위 환자들과 보호자들 조차 자신의
입장을 뒤로한 체 잘 알지도 못 하는 한 노조모와 손자사이를 방해하지 말라
는 눈빛을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간호사 선생 그 양반은 좀 더 있게 해주면 안 되겠소..."
가슴에 커다란 바늘을 꽂고 있던 할아버지 한분께서 힘겹게 한 마디를 던졌다.
택근아 택근아만을 자신의 전부인양 연신 읊조리고 있는 혼수상태의 할머니와
넋이 나간듯 그 자리만을 지키며 중환자실 전체가 꿈틀거리도록 슬픔과 마주 서
있는 남자 할머니가 무슨 사연으로 택근아 택근아만을 부르고 있는지는 알 수 가
없지만 그 사람이 누구 인지는 모두가 훤히 짐작 할 수 있었다. 이들의 모습에
간호사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마감시간이라 자리를 피해달란 말을 할수가
없었다. 간호사가 붉그레 얼굴을 접고 떠나자 택근은 할머니의 곁으로 바짝 다가섰
다.
검버섯과 마른버짐이 곳곳이 피어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한참을 어루만지다가 중환자
실을 잰 걸음으로 힘없이 걸어나갔다.택근의 눈시울은 이미 시뻘겋게 붉어져 있었고
병원복도 대기실에서 걱정스레 앉아있는 가족들을 한번 힐끔 바라보다가 맺혀있던 눈
물을 끝내야 떨구어 놓고 말았다.
"에이시팔 이러다 할머니 죽나보다.."
가족들이 택근을 바라보았을 때 이미 택근은 정문을 지나 휑하니 어디론가 뛰쳐나가
고 난 후였다.
백합같던 얼굴의 꽃잎을 다 지우시던 그날까지 할머니는 택근의 스승이자 친구였다.
그렇게도 정정하시던 할머니가 당료라는 이름으로 쓰러지시던 날이 벌써 십여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시지 않으셨고 주기적으로 일년에 한 차례씩
커다란 홍역까지 치루셨다. 그때마다 택근은 회사를 그만 두거나 장기휴가를 내고는
할머니의 병수발을 도맡아하며 자신의 인생을 할머니의 간호를 통하여 보내고 있었
다.
택근의 무모한 행동에 가족들은 한때 택근을 탓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할머니 약종류만 해도 20가지가 넘어 아침,점심,저녁때 먹는 것이 모두 틀리고 혈
압 잴 줄 아는 사람 있어?"
"그래도 어떻게 들어간 회산데"
택근 엄마의 아쉬운 소리에도 택근은 한점 굽힐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걱정마 할머니만 일어나시면 다시 출근 할 꺼니까... 참 .. 이 알약은 반씩 잘라서 드려야 되 는 거 알지?.."
모두들 할머니가 다시는 일어나시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택근의 집착적으
로 정성스런 간호에 말문을 열지조차 못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점
점 기력이 악화되시고 있었고 미수(米壽)를 넘기시면서 부터는 택근이 주는 약조차
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연거푸 내 뱉기만 하셨다.
"할머니.. 먹어야 돼.. 먹어야 산다구 계우지 말고 삼키란 말이야"
할머니의 입속으로 들어간 약더미들은 잠시간 모두 밖으로 뱉어져 나왔다.택근과 할
머니와의 약 전쟁은 오랜시간 동안을 힘들게 이어져 나갔지만 기력이 약해진 할머니
는 좀처럼 약을 받아들이지를 못 하셨다.
"진짜.. 왜그래... 먹어야 산단말이야....꿀꺽 삼키라구.."
"우웨엑..."
"할머니.. 어떡해서든 좀 삼켜봐"
미량의 물약 조차도 할머니의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모두다 계워내고 있었
다. 부화가 오른듯 약을 먹이던 숟가락을 택근은 이내 내동댕이 쳐 버리고 말았다.
"에이... "
택근은 핑 도는 눈물을 감추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다.할머니 방문을 향해 큰 소리를 질렇다...
"죽을라고 그래..약 안먹으면 죽는다니까 .. 억지로라도 먹어야 살지... "
주루룩 떨어지는 눈물을 삼키며 택근은 한참을 누워 있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고비
늙어진 할머니를 바라보는 하루하루는 택근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날들 이기만
하였다.
"에이 소주나 한잔 먹고 잡다"
택근은 할머니 간호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시간마다 혈압을 재고 심장소리
를 체크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 일이 다반사였다.이번에도 택근은 할머니와 약
전쟁을 벌이다 끝끝내 이기지 못하고 제 방에 들어갔다.
주체 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택근은 시나브로 잠이
들어 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꿈일까 할머니가 택근의 옆에 일어서 있었다.택근은
눈을 비비고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았다.
"하.. 할머니"
분명한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무척이나 괴로운 듯 숨을 허억헉 허억헉 몰아 쉬시고
계셨다.
할머니의 한손에는 검정색 비닐봉지가 조심스레 쥐어져 있었고.. 이내 할머니는 그것
을 택근에게 내밀었다.
"태..태..근..아.... 소...주...사...왔...다.. 먹..고..자..라"
택근이 일어나서 할머니에게 다가서기도 전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발라당 쓰러지셨
다.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되고 만것이다. 할머니의 손
에 쥐어진 검정색 비닐봉지 속에는 소주한병이 소중한 보물인 듯 할머니와 함께 포근
히 잠들어 있었다.
3분 거리면 갔다올 슈퍼마켓을 할머니는 40분이 넘도록 가탈걸음으로 헉헉거리는 가
슴을 이끌고 애면글면 다녀 오신 것이였다.
"택근아.. 택근아.. 택근아... 택근아.."
중환자실은 아직도 미세하게 그의 이름자가 거풀거리고 있었다. 택근이 밖에서 돌아
온 시간은 면회 마지막 시간을 조금 넘어서 였다. 소주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그는 취
기에 볼그레진 얼굴을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 나왔어.. 보고 싶었지.. 나.. 나.."
택근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나.. 할머니가 사준 소주한병 다 먹고 왔어... 그랬더니 좀 취하네..."
이미 눈동자엔 눈물이 글썽이고.. 택근은 할머니의 손을 살포시 쥐었다.
"시팔 안 먹고 평생 아껴 둘 라고 했는데... 할머니 생각이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
지..."
택근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갓난아이 살결 만지 듯 매만지며 삼켰던 눈물을 뚝
뚝 흘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나 소주 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다녀온거야"
택근은 이내 울음을 참지 못 하고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정말 .. 정말.. 빈말로 한건데... 소주 먹고싶다고.. 한거...할머니 미워서 그런거 아니였어...
근데.. 왜그랬어... 그거 사오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아팠어 ... 할머니... "
가족들도 고개를 들지 못 하였다. 모두들 허공만을 바라보며 엉엉.. 슬픔의 눈물만
을 가물가물 쏟아내고 있었다.
"흑흑... 평생.. 그렇게 주기만 하고 가면... 난 어떡하라고... 흑흑..어.. 그렇게 가면 어떡해... 난..
할머니한테 뭐 해주라고....할머니 ..응..흑흑흑....왜 그랬어.. 정말.."
택근의 얼굴에서 볼그랗던 홍조가 사라질 즈음 할머니는 그렇게도 되뇌이던 택근이라
는 이름조차도 떨구어 버린채 아름답던 한늬의 생을 마감하셨다. 중환자실은 더 이
상 택근아..택근아..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택근의 처철한 목청만이 온 병원을
메아리치 듯 울려 퍼져나갔다.
"할머니... 할머니...으아아악..."
어린시절 할머니에게 예의범절과 교육을 배우고 자라왔던 택근은 소위 명문대를 졸업
하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엘리트였다.하지만 지금 택근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은 전
혀 찾아볼 수 가 없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택근은 의사한테부터 시작해서 친척들에게 까지 지청구를 부리
며 강짜를 놓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
"택근아 니가 그러면 안돼지.. 장손이 정신차리고 장례준비 해야지"
"할머니.. 살려내.. 우리 할머니 살려 내라고"
"그래도 오래도록 정정하게 사셨으니 호상이라 생각하고 정신차려"
"고추먹는 소리 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얼어 죽을 놈의 호상이 어딨어 "
택근은 무섭게도 그를 달래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쳤다.장례를 준비해야 하는데도 실
성한 듯 할머니를 끌어안고 보내주지 않는 택근 때문에 할머니의 장례식은 그만큼 늦
춰지고 있었다.
택근은 오래도록 늘어진 느티나무 마냥 할머니를 지키다가 지쳐 이내 군드러지듯 쓰
러져 잠이 들었다.
그사이 할머니의 장례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혹시 택근이 깨어나 아망이라
도 부리지 않을까한 노파심에 가족들은 서둘러 장례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후 택근이 나타난 시간은 두어시간이 지난 후 였다. 깔끔하게 상복을 차려입고 반
듯한 모습으로 상가집에 오른 택근은 할머니의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약간 실그
러져 있는 사진을 바로 세우며 택근은 방시레 웃고 있었다. 가족들은 택근의 그런 모
습을 의아해 하며 바라보고만 있었다.
"뭣들해 어서 할머니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지... "
"태..택근아"
"엄마 홍천 지씨 아저씨네 연락했나요?... 부고는 서신으로 써 놨으니까 가까운 곳부터 인편으로
보내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전화로 연락 해놨으니까 엄만 여기 적힌 곳만 연락하세요.. 그리고
음식도.. 좀 더 준비해야 겠데.."
두어시간전 택근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그는 그곳에 서 있었다. 택근의 빠른
부고와 정확한 장례준비로 인해 할머니의 장례식은 많은 상객들과 일가 친적들로 인
하여 분주히 이루어 지고 있었다.
"호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택근은 마음을 도슬러 먹은 듯 장례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혹이나 택
근의 행동에 안좋은 사태까지 예상해야 했던 차이기에 지금 택근의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기만 했던 것이 였다.
그렇게 장례는 무사히 치루어지고 말았다.
할머니의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약간은 지친 듯 힘이들어 보
였지만 얼굴은 마냥 피곤 하지는 않은 표정이였다. 집으로 들어온 택근은 먼저 할머
니방을 들어갔다. 걸레를 들고 할머니방을 정성껏 쓸고 닦기 시작했다.
"깨끗하다..."
택근엄마는 택근이 안돼 보였는 지 그의 얼굴을 살포시 바라보고 있었다.
"택근아 할머니 좋은데 가셨을 거야... "
"그럼, 당연하지 우리 할머니는 천사였거든"
"너 괜찮은거지?"
"걱정마 이제 나도 할머니 때문에 축 쳐져있지 않을 거니까 이젠 나도 회사
출근 하고 장가도 가야지"
사촌동생 석훈은 툭하고 택근에게 말을 건넸다.
"난 형이 장례식도 못 올 줄 알았는데"
택근의 모습이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럴뻔 했지.. 할머니 돌아가신 순간 울다가 쓰러졌을 때만 해도 내 정신
이 아니였어"
가족들은 침을 꾸울꺽 삼키며 궁금했던 이유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 꿈꿨어.."
"할머니 꿈"
몸이 약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자신의 생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 희미하게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작은방 한켠에
서 작은 소리가 들렸 던 것이다.
"에이 소주한잔 먹고잡다"
라는 택근의 희미하지만 아주 또렷한 말이 할머니는
마흔이 넘도록 장가도 안가고 십년이 넘도록늙은 할미 병수발을 극진이 해주는 택근
을 위해 소주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사리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임을 거부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오로지 택근에게 소주한병을 사주어야 한다는
생각하나만으로 천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태..끈아... 하..할..미가.. 소..주.. 사..다 ..주..랴.."
택근은 이미 고단한 잠을 자고 있던 터였다. 할머니는 죽을힘을 다하여 밖을 나왔고
코 앞에 있는 슈퍼마켓 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 딪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선물을 위하여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다.
소주를 택근에게 가져다 준 할머니는 크게 미소를 지으시고는 택근을 깨우고 계셨
다.
숨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어떻해든 택근을 깨워서 소주 한잔을 채워주고 싶은 심정이였지만 잠든 택근은
좀처럼 일어나지를 않았고 할머니는 택근아.. 소주 사 왔다.. 먹고 자라 ..
택근아.. 택근아..하고
택근을 깨우다가 다시는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 신 것 이였다.
"할머니는 나를 깨우고 계셨던 거야.. 일어나서 소주 먹고 자라고...
그거 보고 싶으셔서...택근아..택근아를 부르신거야"
택근의 눈망울이 사뿐이 맺혔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했다.
"꿈에서 내가 그 술 다 먹었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좋아서 싱글벙글 하시라구"
택근은 그렇게 잠에서 깨었지만... 할머니의 웃는 모습은 정말 생생히 기억났다.
"택근아 얼른 일어나서 이제 할미 술 한잔 줘야지.. 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런 꿈을 다 꿀수가 있지?"
석훈의 물음에 택근은 고개를 살며시 저었다
"아니 그건 꿈이 아니였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수 있다는 거... "
택근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먹구름 넘어 떠있는 별처럼, 갯벌속의 숨쉬고 있는 조개처럼 할머니는
그렇게 계신거야
보이지 않는 조금 먼 곳에...내가 외롭고 힘들때 느닷없이 나타나서
택근아 힘내라... 하시며
나타나실 거야..."
택근엄마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젠 내가 할머니 술잔을 채워 줄
차례거든.."
택근은 말없이 잠시간을 묵묵히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사진을 한참을 뚜렷이 바라보
다가 피식 웃음을 한번 던지고는 벌러덩 자리에 누웠다.
창넘어로 보이는 구름사이로 까치놀이 아름답게 하늘을 치장하고 있었다.
이 시간이면 할머니가 노상 바라보시 던 바로 그 하늘이였다. 택근은 찔끔 흐른눈물
을 손등으로 훔쳐내며 지그시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할머니.... 나 ..나.. 정말 행복한 놈인것 같아..."
<마침.> 천국에 계신 할머니께...
추천3
댓글목록
박민순님의 댓글
박민순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할머니가 그리운 날 입니다
건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