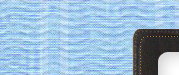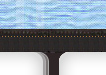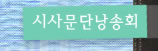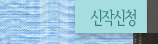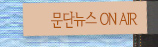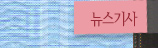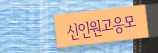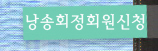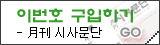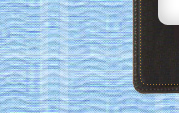[미니픽션]- 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 댓글 1건
조회 2,059회
작성일 2009-11-17 12:19
) 댓글 1건
조회 2,059회
작성일 2009-11-17 12:19
본문
미니픽션
- 정 - 시와 글/ 박 기 준
scene정 #001
생년월일 : 1980.11.22일
태 생 : 서울 개여울에서 사생아로 발견 됨
주민번호 : 801122~2100000
성 명 : 효 정
성 별 : 여자
*1
왜냐고
왜, 당신을 택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그저
당신이라는 것 밖에는
더 이상의 까닭은 없었다고,
그래서
늘 당신이 보이는 곳에 남아
당신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었다고
왜냐고,
왜, 당신을 사랑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더 없는 진실을 보여주었기에,
그래서 언제나 나를 당신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였다고
그리고 그 마음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고
왜냐고
왜, 당신을 아직까지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내 가슴에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소중함이기에,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당신의 입김으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지금까지 사랑하였노라고
그리고 먼 후일
당신이 물으신다면,
우리의 만남을 후회한적 없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이 되어 있고
당신이 이만큼 내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바랄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에 묻힌 T. V 에 내장산 단풍의 그림이 나오는 가을 한편의 시간이 흐를 때 효정은 저녁 준비에 여념 없습니다. 상위에 놓이어지는 수저 두벌위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식탁위에 홀로 앉아서 넋을 빠트린 듯 국그릇을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식으면 또 데워다 놓습니다. 식탁보를 덮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T. V에서 7080프로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방바닥에 밥상의 파편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의 파편에 찢겨진 몸으로 이웃들의 노크소리도 외면한 채로 저녁상을 또 차립니다. 개도 때려잡을 때는 이웃마을도 다 안다는데 회색 짙은 도시의 소음이 이들의 소리를 뺏어 갑니다. 7080도 끝나고 가을 깊은 밤 구석에 처박힌 효정의 독백은 흐느낌으로 7080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꺼진 T. V에 시선을 꽂은 채로 ......,
scene정 #002
너무나 많이 맞아서 이제는 정이 들었나봅니다.
구부러진 손가락과 피멍들어 터진 손등은 당신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닦아주던 때만큼이나 아팠습니다. 눈 주위에 모인 제 피의 무덤은 동공을 감싸 안은 채로 사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 제 팔을 꺾으며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뜯을 때에는 당신이 한강다리위에서 밑을 보며 삶을 힘들어 할 때 뒤에서 감싸주었던 만큼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 외출해서 돌아 올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반기는 저에게 술 취한 상태로 현관에서 구둣발로 제 발을 걷어 찰 때에는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고통이 땅에서부터 퍼져 올라와 당신 가족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직장 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허리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고 한 눈 질끈 감고 옷가게와 빵가게 쇼윈도를 지나칠 때만큼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 누워있는 제 허리와 배를 발로 찰 때에는 당신의 거친 숨소리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 할 때만큼이나 아기도 당신을 알아보고 10개월도 멀다고 3개월도 채 안되어 핏덩이로 제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니고 사타구니로 나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scene정 #003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가슴에는 봉긋한 젖멍울 두 개가 있는 것이 당신이 더듬는 행복의 산물인 줄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선혈로 얼룩진 제 사타구니에 한 핏덩이를 보고서야 저에게 있어 그것의 하나는 부모의 무덤이고 하나는 자식의 무덤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맞아보고서야 제 무덤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저 아픈 만큼이나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제 어쩌지요? 저에게는 당신을 위해 눈을 뜨고 미소 지을 힘조차도 없으니 말입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도 앓아누웠답니다. 오늘도 그저 누워서 퇴근해 들어오는 당신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왜 이렇게 서글픈지 제 어머니의 모습조차도 기억이 안나 는 이 아픔은 하도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아서 아마도 당신에게 정이 들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당신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이 얼마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해도 해도 얼마나 끝이 안보였으면 나에 대한 사랑도 가정을 향한 희망마저도 자식을 위한 소망마저도 제 몸뚱이에게다 버리시겠습니까. 어쩌지요? 나 이제 당신에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두려움도 아픔도 잊은 채로 오늘도 당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니 말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제 얼굴의 상처로 인해 당신은 또 때리시겠지요. 당신이 세상을 통해서 느끼시는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저를 때리시는 거라면 저는 좁은 공간에서 너무 아파서 뜨거운 육체의 꿈틀거림으로 소스라치는 살 떨림의 아픔으로 당신을 제 눈 속에 품으렵니다. 어쩌지요? 이제 당신에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바닥에 엎어져 출근하는 당신의 소리를 향해 인사하니 말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하루를 지내소서. 그저 당신이 편하게 지내시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침 문 닫히는 소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이 될 줄은 차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잠을 자야겠습니다. 당신에게 전화 오는 그 순간까지라도 꿈을 꾸고 싶습니다.
scene정 #004
꿈을 꿉니다.
육지의 피부 끝 살갗이 닿을 수 없는 손톱 등 같은 벼랑과 벼랑 사이에는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입니다. 어데서 부터인가 너울의 파도는 알 수 없는 아픔의 바람을 몰고 옵니다. 평온하기만 하는 바다는 너울의 풍랑으로 오늘의 행복을 갯바위에서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평선에 배를 띄우고 행선을 알 수 없는 항해하는 배에 시선을 가두게 해 놓고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수평선의 춤사위로 음악을 들려줍니다. 악보도 없는 연주자도 없는 넓은 무대에서 바다라는 악기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scene정 #005
저 들려오는 음악은 당신이 참 좋아하던 음악입니다.
인사동커피숍에서 인천 월미도까지 때로는 동해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울릉도까지도 당신과 함께 바다의 음악을 들으려 제 젊음의 순정은 따라 다녔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뿐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행복보다는 미래보다는 꿈의 실현보다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제 운명이며 인연에 대한 제가 치러야 할 마땅히 받아 들여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생아로 자라 홀로서기 했기에 가족의 따뜻함 속에 어우러져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가정에 울타리의 행복이 소중함을 알기에 당신을 사랑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당신이 하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scene정 #006
그러나
하얀 웨딩드레스는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제 몸을 하늘로 날게 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모르던 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래가 되어 아이들을 찾습니다. 어찌 된 건지 아이들이 안보입니다. 미끄럼틀 위에 한 남자아이가 있어 찾아 술래 되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숨을 차례입니다. 아 어쩌지요 숨을 곳을 못 찾고 땀 흘리며 해매이고 있습니다. 저는 수평선이 보이는 벼랑 끝자락그네위에 앉아서 숨었다고 나 찾아봐라 하며 요람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 모양이 우습기도 하지만 멀리서 뛰어오는 남자아이를 보고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scene정 #007
처음 보는 여인이 그네 타는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가야 힘들지 미안하구나. 그나마 너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로 속삭이며 사라져 가는 여인은 다름 아닌 누워있는 저였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저승사자도 귀를 막은 당신의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쪼개진 창살무대에서 악보도 연주자도 없는 음악을......,
*2
아기를 등에 업고
논길을 거니는 여인아
어이해 두 손은 허공을 허집이고 있느뇨?
맑은 하늘이 심술구나
땅거미가 술래 되어 그대를 찾는데
어이해 숨을 줄 모르고 산발머리로 그리 휘청하느뇨?
논길 벗어나 산을 올라
어느 골짜기에 머물러 쓰러질까나
낙엽이 뒤 따라가며 부르거늘
외딴 초가 굴뚝에 연기 나걸랑
따스한 아궁이 김나거들랑
그리 숨어 들 거라
먹구름이 너를 덮으리니
보이지 않게 꼭꼭 숨 거라
아기를 등에 업고
들판을 거니는 여인아
한 손에 행복 보자기,
또 한 손에 먹을거리 싸들고
까치 발걸음을 딛어야 할 터인데
어이해 허공을 휘 젖으며
가느다란 나뭇가지는
왜? 들고 땅을 치느뇨?
아
포대기에 파묻힌 어린아이
세태의 삐삐한 춤바람에 고개 덜렁 나와
젖혀진 채, 숨 멈추었나니
묻을 땅 없어
숨을 아궁이 없어
젖가슴에 무덤 만들고 죽은 자식, 등에 업었구려
누덕누덕
기운 포대기는
설움 바느질, 손마디 마디에 바늘 찔린 눈물로 가슴 찢어 꿰매었구려
아
혈 꽃 수 놓은 어진 모정
하늘의 한이 되고
타는 가을사이로 빠져나오는 바람이 되는구나
그려, 그려
어~여 실컷 땅을 치시게나
자네 자식 묻은 가슴에 풀이 돋아나면
한 맺힌 꽃봉오리 눈물 달라 때 쓸 터니
나뭇가지 부러지면
십자가 만들어 자식 묘에
비목(碑木)이라도 만들어 세우구려!
자식 묻거들랑
누덕누덕 기운 포대기
깃발 만들어 한 맺힌 설움 휘 뿌리며 돌아서시게나.
그려, 그려
젖가슴에 묻은 자식 세월 지나도 썩지 않을 터니
뫼 떠나 거니시게 논길이면 어떻고 들판이면 어떠랴
회색빛 맴도는 메마른 사이로 아니 가면 될 터
이 땅위에 자네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있겠냐마는
거니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머니의 바늘이요 땅이 아니겠는가!
*1/ [시제]왜 *2/[시제]미쳐가는 여인
2009.11.16~17. 거제도 장승포 방파제에서 씀.
- 정 - 시와 글/ 박 기 준
scene정 #001
생년월일 : 1980.11.22일
태 생 : 서울 개여울에서 사생아로 발견 됨
주민번호 : 801122~2100000
성 명 : 효 정
성 별 : 여자
*1
왜냐고
왜, 당신을 택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그저
당신이라는 것 밖에는
더 이상의 까닭은 없었다고,
그래서
늘 당신이 보이는 곳에 남아
당신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었다고
왜냐고,
왜, 당신을 사랑하였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더 없는 진실을 보여주었기에,
그래서 언제나 나를 당신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였다고
그리고 그 마음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고
왜냐고
왜, 당신을 아직까지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내 가슴에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렇게 조금씩 쌓여가는 소중함이기에,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당신의 입김으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지금까지 사랑하였노라고
그리고 먼 후일
당신이 물으신다면,
우리의 만남을 후회한적 없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이 되어 있고
당신이 이만큼 내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바랄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밖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에 묻힌 T. V 에 내장산 단풍의 그림이 나오는 가을 한편의 시간이 흐를 때 효정은 저녁 준비에 여념 없습니다. 상위에 놓이어지는 수저 두벌위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식탁위에 홀로 앉아서 넋을 빠트린 듯 국그릇을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식으면 또 데워다 놓습니다. 식탁보를 덮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T. V에서 7080프로의 음악이 흘러나올 때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방바닥에 밥상의 파편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의 파편에 찢겨진 몸으로 이웃들의 노크소리도 외면한 채로 저녁상을 또 차립니다. 개도 때려잡을 때는 이웃마을도 다 안다는데 회색 짙은 도시의 소음이 이들의 소리를 뺏어 갑니다. 7080도 끝나고 가을 깊은 밤 구석에 처박힌 효정의 독백은 흐느낌으로 7080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꺼진 T. V에 시선을 꽂은 채로 ......,
scene정 #002
너무나 많이 맞아서 이제는 정이 들었나봅니다.
구부러진 손가락과 피멍들어 터진 손등은 당신의 얼굴을 만지며 눈물을 닦아주던 때만큼이나 아팠습니다. 눈 주위에 모인 제 피의 무덤은 동공을 감싸 안은 채로 사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 제 팔을 꺾으며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어뜯을 때에는 당신이 한강다리위에서 밑을 보며 삶을 힘들어 할 때 뒤에서 감싸주었던 만큼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 외출해서 돌아 올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반기는 저에게 술 취한 상태로 현관에서 구둣발로 제 발을 걷어 찰 때에는 말로도 표현 할 수 없는 고통이 땅에서부터 퍼져 올라와 당신 가족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직장 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허리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입고 싶은 것 못 입고 한 눈 질끈 감고 옷가게와 빵가게 쇼윈도를 지나칠 때만큼이나 아팠습니다. 당신이 누워있는 제 허리와 배를 발로 찰 때에는 당신의 거친 숨소리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 할 때만큼이나 아기도 당신을 알아보고 10개월도 멀다고 3개월도 채 안되어 핏덩이로 제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니고 사타구니로 나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scene정 #003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제 가슴에는 봉긋한 젖멍울 두 개가 있는 것이 당신이 더듬는 행복의 산물인 줄만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선혈로 얼룩진 제 사타구니에 한 핏덩이를 보고서야 저에게 있어 그것의 하나는 부모의 무덤이고 하나는 자식의 무덤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맞아보고서야 제 무덤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저 아픈 만큼이나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제 어쩌지요? 저에게는 당신을 위해 눈을 뜨고 미소 지을 힘조차도 없으니 말입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도 앓아누웠답니다. 오늘도 그저 누워서 퇴근해 들어오는 당신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왜 이렇게 서글픈지 제 어머니의 모습조차도 기억이 안나 는 이 아픔은 하도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아서 아마도 당신에게 정이 들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당신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이 얼마나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해도 해도 얼마나 끝이 안보였으면 나에 대한 사랑도 가정을 향한 희망마저도 자식을 위한 소망마저도 제 몸뚱이에게다 버리시겠습니까. 어쩌지요? 나 이제 당신에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두려움도 아픔도 잊은 채로 오늘도 당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니 말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제 얼굴의 상처로 인해 당신은 또 때리시겠지요. 당신이 세상을 통해서 느끼시는 아픔이 있어서 그래서 저를 때리시는 거라면 저는 좁은 공간에서 너무 아파서 뜨거운 육체의 꿈틀거림으로 소스라치는 살 떨림의 아픔으로 당신을 제 눈 속에 품으렵니다. 어쩌지요? 이제 당신에게 정이 들었나 봅니다. 바닥에 엎어져 출근하는 당신의 소리를 향해 인사하니 말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하루를 지내소서. 그저 당신이 편하게 지내시기를 바랄 뿐이랍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침 문 닫히는 소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음악이 될 줄은 차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잠을 자야겠습니다. 당신에게 전화 오는 그 순간까지라도 꿈을 꾸고 싶습니다.
scene정 #004
꿈을 꿉니다.
육지의 피부 끝 살갗이 닿을 수 없는 손톱 등 같은 벼랑과 벼랑 사이에는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입니다. 어데서 부터인가 너울의 파도는 알 수 없는 아픔의 바람을 몰고 옵니다. 평온하기만 하는 바다는 너울의 풍랑으로 오늘의 행복을 갯바위에서 집어 삼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수평선에 배를 띄우고 행선을 알 수 없는 항해하는 배에 시선을 가두게 해 놓고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수평선의 춤사위로 음악을 들려줍니다. 악보도 없는 연주자도 없는 넓은 무대에서 바다라는 악기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scene정 #005
저 들려오는 음악은 당신이 참 좋아하던 음악입니다.
인사동커피숍에서 인천 월미도까지 때로는 동해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울릉도까지도 당신과 함께 바다의 음악을 들으려 제 젊음의 순정은 따라 다녔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뿐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행복보다는 미래보다는 꿈의 실현보다는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 제 운명이며 인연에 대한 제가 치러야 할 마땅히 받아 들여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생아로 자라 홀로서기 했기에 가족의 따뜻함 속에 어우러져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가정에 울타리의 행복이 소중함을 알기에 당신을 사랑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에 당신이 하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scene정 #006
그러나
하얀 웨딩드레스는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제 몸을 하늘로 날게 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모르던 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래가 되어 아이들을 찾습니다. 어찌 된 건지 아이들이 안보입니다. 미끄럼틀 위에 한 남자아이가 있어 찾아 술래 되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숨을 차례입니다. 아 어쩌지요 숨을 곳을 못 찾고 땀 흘리며 해매이고 있습니다. 저는 수평선이 보이는 벼랑 끝자락그네위에 앉아서 숨었다고 나 찾아봐라 하며 요람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 모양이 우습기도 하지만 멀리서 뛰어오는 남자아이를 보고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scene정 #007
처음 보는 여인이 그네 타는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가야 힘들지 미안하구나. 그나마 너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로 속삭이며 사라져 가는 여인은 다름 아닌 누워있는 저였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저승사자도 귀를 막은 당신의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쪼개진 창살무대에서 악보도 연주자도 없는 음악을......,
*2
아기를 등에 업고
논길을 거니는 여인아
어이해 두 손은 허공을 허집이고 있느뇨?
맑은 하늘이 심술구나
땅거미가 술래 되어 그대를 찾는데
어이해 숨을 줄 모르고 산발머리로 그리 휘청하느뇨?
논길 벗어나 산을 올라
어느 골짜기에 머물러 쓰러질까나
낙엽이 뒤 따라가며 부르거늘
외딴 초가 굴뚝에 연기 나걸랑
따스한 아궁이 김나거들랑
그리 숨어 들 거라
먹구름이 너를 덮으리니
보이지 않게 꼭꼭 숨 거라
아기를 등에 업고
들판을 거니는 여인아
한 손에 행복 보자기,
또 한 손에 먹을거리 싸들고
까치 발걸음을 딛어야 할 터인데
어이해 허공을 휘 젖으며
가느다란 나뭇가지는
왜? 들고 땅을 치느뇨?
아
포대기에 파묻힌 어린아이
세태의 삐삐한 춤바람에 고개 덜렁 나와
젖혀진 채, 숨 멈추었나니
묻을 땅 없어
숨을 아궁이 없어
젖가슴에 무덤 만들고 죽은 자식, 등에 업었구려
누덕누덕
기운 포대기는
설움 바느질, 손마디 마디에 바늘 찔린 눈물로 가슴 찢어 꿰매었구려
아
혈 꽃 수 놓은 어진 모정
하늘의 한이 되고
타는 가을사이로 빠져나오는 바람이 되는구나
그려, 그려
어~여 실컷 땅을 치시게나
자네 자식 묻은 가슴에 풀이 돋아나면
한 맺힌 꽃봉오리 눈물 달라 때 쓸 터니
나뭇가지 부러지면
십자가 만들어 자식 묘에
비목(碑木)이라도 만들어 세우구려!
자식 묻거들랑
누덕누덕 기운 포대기
깃발 만들어 한 맺힌 설움 휘 뿌리며 돌아서시게나.
그려, 그려
젖가슴에 묻은 자식 세월 지나도 썩지 않을 터니
뫼 떠나 거니시게 논길이면 어떻고 들판이면 어떠랴
회색빛 맴도는 메마른 사이로 아니 가면 될 터
이 땅위에 자네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있겠냐마는
거니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머니의 바늘이요 땅이 아니겠는가!
*1/ [시제]왜 *2/[시제]미쳐가는 여인
2009.11.16~17. 거제도 장승포 방파제에서 씀.
추천3
댓글목록
허혜자님의 댓글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담은
좋은 작품 감명깊게
감상하였습니다
건강하십시요.